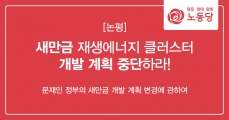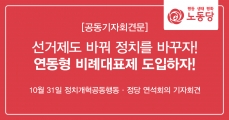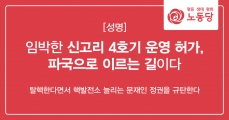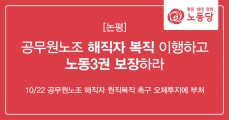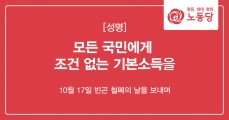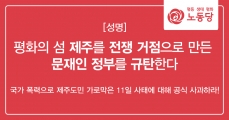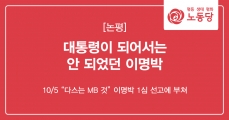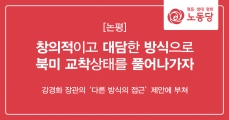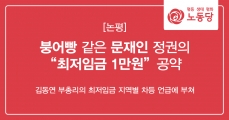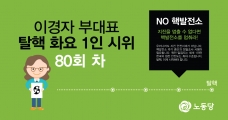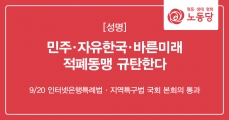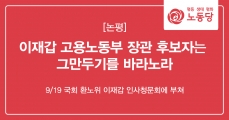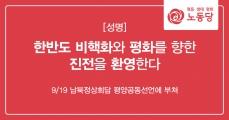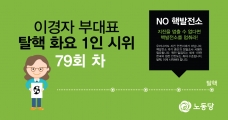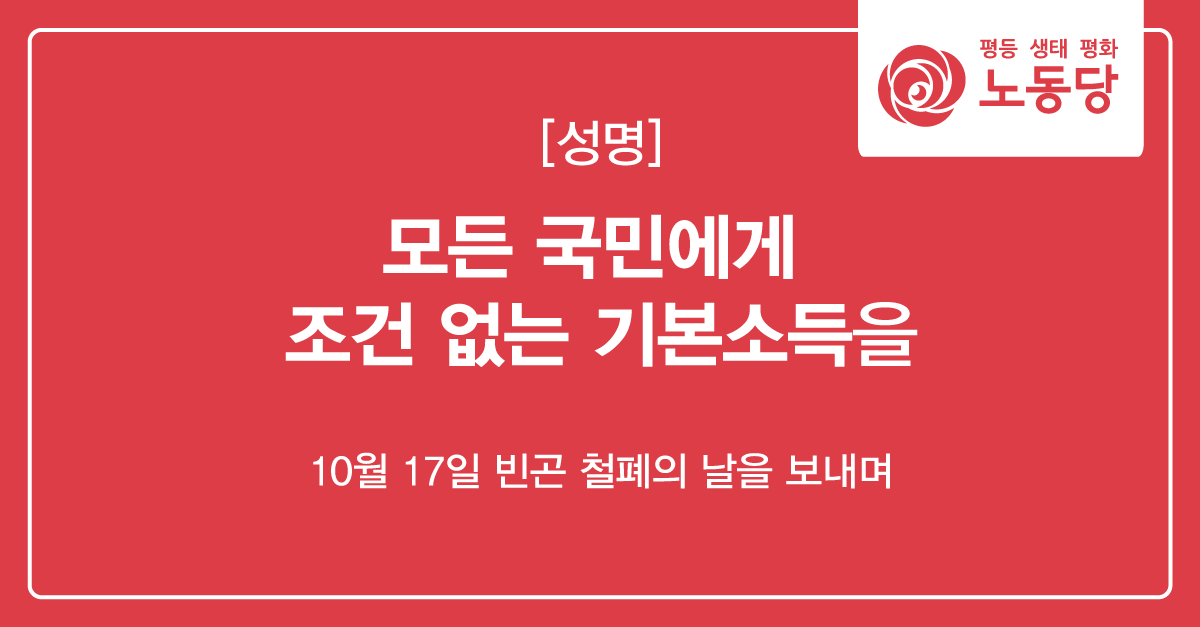
[성명]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보내며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다. 1987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절대빈곤 퇴치 운동 기념비’ 개막식을 계기로 빈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데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1992년 유엔총회에서 이날을 기념해 ‘세계 빈곤 퇴치의 날’로 정했다. 한국에서는 빈곤사회연대가 매년 이날을 ‘빈곤 철폐의 날’로 명명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유엔이 선언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인구가 기아와 절대 빈곤에 처해 있다.
경제 규모 세계 12위 수준의 한국도 빈곤의 문제가 나라 밖 이야기일 수 없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3만 명에 이르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도 93만 명을 헤아린다. 상위 0.1% 고소득자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가난한 사람의 1000배에 달하고, 상위 1%가 1인당 6.5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한편 114만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한다. 이처럼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빈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다. 노동당은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보내며, 이 사회를 불평등과 빈곤에 고통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싸움에 박차를 가하고자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은 불안이 만연한 시대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이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을 보장한다지만, 돈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 제도를 헌법에 담아내자는 것이 노동당의 제안이다.
노동당의 2017년 기본소득 정책은 기본소득세와 생태세 신설,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사회배당 월 30만원, 토지배당과 생태배당 각 5만원씩, 합하여 모든 국민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조세형 모델에 속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자본축적 양식으로 부상한 플랫폼 경제의 부상에 맞춰 조세형 모델에 공유지분권 모델을 결합할 것을 제안한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치 창출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공유부로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전체 사회가 일정한 지분권을 갖는 것으로 설정해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의 부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에 속하는 공유부로서 지식이 사회적 부의 생산에서 중심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지만 이로부터 생산된 부가 임금과 세금으로 이전되는 몫은 전통 산업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재원으로 삼는 기본소득은 변화된 자본축적 양식에 대응하는 분배 정의의 표현이다. 또한 조세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기본소득 재원의 조세정치적 불안정성을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의 복지 정책의 기조인 선별적 복지로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아동수당 지급 선별 과정을 보면 그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여 명 중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5천만 건에 달하는 증빙 자료가 수집됐고, 그 과정에 터무니없는 행정 인력과 비용의 낭비가 초래됐다.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을 전제로 실업, 질병, 노령 등 예외적 곤궁을 선별적 복지를 통해 구제하겠다는 전통 복지국가의 접근은 완전고용의 몰락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엄연한 경제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이것이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보내는 노동당의 주장이다.
2018년 10월 17일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
 [논평]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논평]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 브리핑] 이갑용 대표, 금호아시아나 재벌 갑질 규탄 집회 참석
[ 브리핑] 이갑용 대표, 금호아시아나 재벌 갑질 규탄 집회 참석